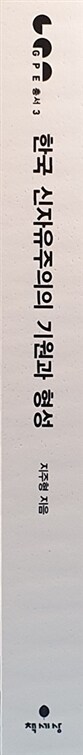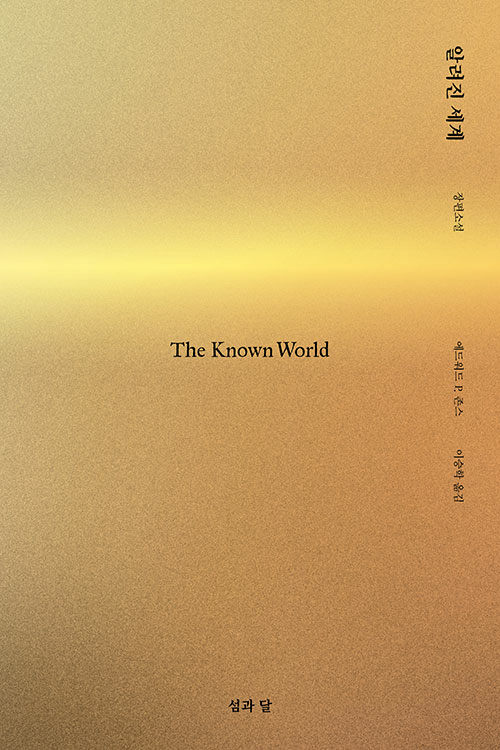‘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지금 보는 것은 어제의 그 빛 아래에서가 아니다. 낡은 지도처럼 알려진 미국 노예제의 세계, 그 면면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것은 다루어지는 사실이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인물들의 “첫 날과 마지막 날,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날을 그들의 ‘신’으로서 바라”보는 역설적으로 인간적인 형식 때문이다. 흑백, 남녀, 선악, 자연과 초자연의 이분법과 예상가능한 온갖 트라우마를 무심하게 건너버리는 문장이 리듬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텔레파시를 품은 채 다가오고 우리는 다시 나아간다. “우주는 시종일관 괴상한 짓을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자란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하는 또 하나의 방식”(에드워드 존스), 바로 문학!
2000 ~ 2024
21세기 최고의 책
기억할 책, 함께할 책
2025년을 맞아 알라딘은 21세기의
첫 25년을 갈무리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25년을 갈무리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알라딘은 작가, 번역가, 편집자, 출판인, 연구자, 활동가, 언론인 등 책 주변의 106인에게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출간된 1,118,869종의 책(참고서, 잡지 제외) 중에서 '21세기 최고의 책' 10권을 골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고에 대한 기준은 각자 다를 것이기에, '기억할 책, 함께할 책'이라는 부제를 통해 '지난 25년간 출간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현재의 세계에 영향을 끼친 저작,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더 많이 읽혀야 할 책'이라는 느슨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이 요청은 출판계 전체를 아우르거나, 독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는 등 각자의 고민을 거쳐 다양한 양태로 도착했습니다. '최고의 책'을 고르는 완전하고 무결한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는 작고 세심한 예외들을 허용하기로 했고 덕분에 목록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무엇인가가 되었습니다. 책 주변의 106명이 각자의 고민을 통해 고른 '21세기 최고의 책'을 공개합니다.
-
나를 보내지 마가즈오 이시구로 지음, 김남주 옮김 | 민음사 (2009, 2021)
-
타국에서의 일 년이창래 지음, 강동혁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2023)
-
알려진 세계에드워드 P. 존스 지음, 이승학 옮김 | 섬과달 (2024)
-
개인적 체험오에 겐자부로 지음, 서은혜 옮김 | 을유문화사 (2009)
-
채식주의자한강 지음 | 창비 (2007, 2022)
-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로맹 가리 지음, 김남주 옮김 | 문학동네 (2007)
-
끝과 시작비스와바 쉼보르스카 지음, 최성은 옮김 | 문학과지성사 (2016)
-
글쓰기 사다리의 세 칸엘렌 식수 지음, 신해경 옮김 | 밤의책 (2022)
-
상처로 숨쉬는 법김진영 지음 | 한겨레출판 (2021)
-
우치다 다쓰루의 레비나스 시간론우치다 다쓰루 지음, 박동섭 옮김 | 갈라파고스 (2023)
알려진 세계를 추천하는 이유
추천인 소개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주로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가즈오 이시구로의 『우리가 고아였을 때』, 『창백한 언덕 풍경』, 『녹턴』, 『나를 보내지 마』,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프랑수아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마음의 심연』, 『슬픔이여 안녕』, 제임스 설터의 『스포츠와 여가』, 로맹 가리(에밀 아자르)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가면의 생』, 『여자의 빛 』, 『솔로몬 왕의 고뇌』, 미셸 슈나이더의 『슈만, 내면의 풍경』, 야스미나 레자의 『행복해서 행복한 사람들』 등이 있으며, 지은 책으로 『나의 프랑스식 서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