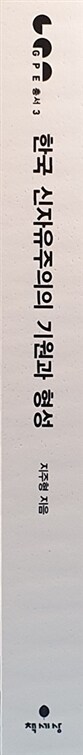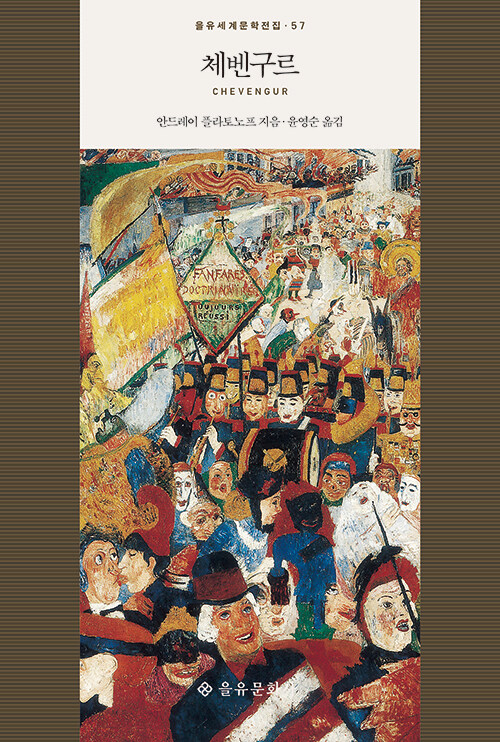21세기 작가 플라토노프 읽기: 공산주의라는 항우울제
2012년 <체벤구르>가 번역 출간되면서 한국에도 플라토노프의 열혈 독자가 꽤 많이 생긴 것으로 안다.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깊게 읽혀야만 하는 ‘우리 시대의 작가’이기 때문이다. 플라토노프라는 특별한 세계에 감화된 전 세계 애독자의 찬탄은 20세기 내내 이어진 바 있다. 파졸리니는 <체벤구르>의 첫 장을 두고 “러시아 문학의 최고로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극찬했으며, 브로드스키는 “다른 작가들과 달리 플라토노프는 자기 시대의 언어에 스스로를 완전히 종속시켰고 그 안에서 심연을 보았다”고 말했다. 소쿠로프는 장편 데뷔작으로 플라토노프의 단편을 선택했으며, 존 버거는 “플라노토프는 이제껏 내가 만난 그 어떤 이야기꾼보다 현대의 가난을 더 깊게 이해했다”라고 썼다. 그뿐인가? 제임슨은 플라노토프를 자신의 유토피아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거로 인용한 바 있으며, 지젝은 베케트, 카프카와 함께 플라토노프를 “20세기의 절대 작가 3인”으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물론 플라토노프는 “실재를 향한 열정”으로 요약되는 지난 20세기의 중대한 증언자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소설들이 (“인류세”라는 말로 거칠게 통칭되곤 하는) 21세기를 사유하기 위한 중요한 원천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 글은 플라토노프의 대표작 <체벤구르>의 동시대적 읽기를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핵심적 지점들을 추려본 것이다.
첫째, <체벤구르>는 인간 이외의 존재자들, 특히 기계와 동(식)물을 다룬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인간보다 기계를 더 사랑하여 기관차와 이야기를 나누는 인물이 등장하는 1부의 이야기가 2부와 3부에서 그의 양아들인 진짜 주인공 사샤 드바노프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은 젊은 시절 과격한 기계신봉자, 급진적 코스미스트였던 플라토노프가 특이한 사회주의적 생태주의자로 변모해가는 서사의 변주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죽음을 견뎌 낸 “우엉”마저도 공산주의를 원하는 곳, “참새”들이 가난과 추위를 인간과 함께 나누는 장소, 인류 전체를 위해 “노동자 태양”이 말 없는 우정의 빛으로 대지를 위로해 주는 세계다.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식)물의 경계에 관한 플라토노프의 놀랍도록 복잡한 탐구는 포스트휴먼과 비인간을 둘러싼 이런 저런 풍문들을 훌쩍 넘어선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둘째, <체벤구르>는 규정될 수 있는 계급 바깥의 인간들, 곧 “이름 없는 잡다한 인간들”을 다룬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기타인간”이라 불리는 소설 속 존재들은 결코 우리에게 익숙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다. 그것은 언젠가 바디우가 “정원외적 요소들 (element surnumeraire)”이라 불렀던 “사회의 셈해지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 혹은 차라리 “다가올 세기의 섬뜩한 알레고리”에 해당하는 노동자 아닌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이 책에서 플라토노프가 보여주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아래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바, 그런 의미에서 플라토노프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동시대인” (McKenzie Wark, Molecular Red: Theory for the Anthropocene, Verso, 2016. 81.)
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벤구르>는 “우울(증)”을 다룬 총체적 보고서로 읽어야 한다. 다만 멜랑콜리로 번역되는 그 우울과는 다르다. 이 책에서 우울, 애수, 향수, 그리움, 슬픔, 고통, 갈망, 권태 등으로 옮겨진 부분들은 모조리 동일한 원어(“toska”)의 번역어로 바꿔 읽어야 한다. 외국어에서 정확한 대응어를 찾을 수 없는 이 특별한 단어에 관해 나보코프는 이렇게 썼다. “가장 깊고 고통스런 수준에서 토스카는 대개 원인불명의 커다란 영적 고통의 감정을 뜻한다. 덜 병적인 수준에서는 영혼의 둔탁한 아픔, 목적 없는 갈망(longing), 병적인 슬픔(pining), 막연한 불안, 정신적 고통(throe)과 동경(yearning)이다. 특수한 경우 그것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향한 욕망, 향수, 애틋함이 될 수도 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권태(ennui)나 지루함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Vladimir Nabokov, Eugene Onegin, a Novel in Verse, vol. 2, Alexander Pushkin, trans. Vladimir Nabokov,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141.
여기서 핵심은 단어의 다의성 자체가 아니라 대상을 가질 수 있는, 그렇기에 동사형을 취할 수 있는 그것의 적극적 용법에 있다. <체벤구르>의 농부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리워했던가? 나는 바로 사회주의를 그리워했던 거야(toskoval).”(198쪽). 토스카는 어떤 것에 관하여(about) 느끼는 우울함보다는 잃어버렸거나 혹은 아예 가져보지 못한 어떤 것을 향한(for) 적극적인 지향과 향수에 더 가깝다.
놀라운 사실은 이 특별한 감각이 ‘같은 것’을 느끼는 다른 존재자를 향할 때 (일시적이나마) ‘정지’될 수 있으며(수없이 등장하는 ‘우정’의 느낌이 가리키는 바가 정확히 이것이다), 그 존재자는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아”라고 말하곤 하는 주인공 사샤는 “오래된 울타리”를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홀로 서 있구나.’ 가을에 덧문이 슬픈 듯이 삐걱거릴 때면, 사샤도 저녁마다 집에 앉아 있기가 우울해졌으며, 덧문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느꼈다. ‘그들 역시 우울하구나!’ 그리고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았다.”(82쪽) 그렇다면 우울(증)만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대의 고리일까? 그렇지 않다. 유토피아를 향한 지향과 노스탤지어의 감정을 연결해주는 고리 또한 바로 이 특별한 정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하자.
자기가 미처 가져보지 못한 것을 향한 그리움을 품은 채 헐벗고 “가난한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자가 자신들의 공통감각(“우울과 고아감각”)을 확장된 우정과 동지애로 바꿔가는 이야기! 공산주의라는 아주 특별한 ‘항우울제’를 통해 독자들을 “토스카의 민병대”로 단련시켜주는 책! 21세기를 위한 필독서 <체벤구르>를 추천한다.
2000 ~ 2024
21세기 최고의 책
기억할 책, 함께할 책
2025년을 맞아 알라딘은 21세기의
첫 25년을 갈무리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25년을 갈무리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알라딘은 작가, 번역가, 편집자, 출판인, 연구자, 활동가, 언론인 등 책 주변의 106인에게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출간된 1,118,869종의 책(참고서, 잡지 제외) 중에서 '21세기 최고의 책' 10권을 골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고에 대한 기준은 각자 다를 것이기에, '기억할 책, 함께할 책'이라는 부제를 통해 '지난 25년간 출간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현재의 세계에 영향을 끼친 저작,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더 많이 읽혀야 할 책'이라는 느슨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이 요청은 출판계 전체를 아우르거나, 독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는 등 각자의 고민을 거쳐 다양한 양태로 도착했습니다. '최고의 책'을 고르는 완전하고 무결한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는 작고 세심한 예외들을 허용하기로 했고 덕분에 목록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무엇인가가 되었습니다. 책 주변의 106명이 각자의 고민을 통해 고른 '21세기 최고의 책'을 공개합니다.
-
체벤구르안드레이 플라토노프 지음, 윤영순 옮김 | 을유문화사 (2012)
-
발터 벤야민 : 화재경보미카엘 뢰비 지음, 양창렬 옮김 | 난장 (2017)
-
1417년, 근대의 탄생스티븐 그린블랫 지음, 이혜원 옮김 | 까치 (2013)
-
아비 바르부르크 평전다나카 준 지음, 김정복 옮김 | 휴먼아트 (2013)
-
기식자미셸 세르 지음, 김웅권 옮김 | 동문선 (2002)
-
동물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야콥 폰 윅스퀼 지음, 정지은 옮김 | 비(도서출판b) (2012)
-
회상나데쥬다 야코블레브나 만델슈탐 지음, 홍지인 옮김 | 한길사 (2009)
-
문화와 폭발유리 로트만 지음, 김수환 옮김 | 아카넷 (2014)
-
바흐친의 산문학게리 솔 모슨 외 지음, 오문석 외 옮김 | 앨피 (2020)
-
치즈와 구더기카를로 진즈부르그 지음, 김정하.유제분 옮김 | 문학과지성사 (2001)
체벤구르를 추천하는 이유
추천인 소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문학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혁명의 넝마주이』 『책에 따라 살기』 『사유하는 구조』 등이, 옮긴 책으로 『<자본>에 대한 노트』(공역)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코뮤니스트 후기』 『영화와 의미의 탐구』(공역) 『문화와 폭발』 『기호계』 등이 있다.